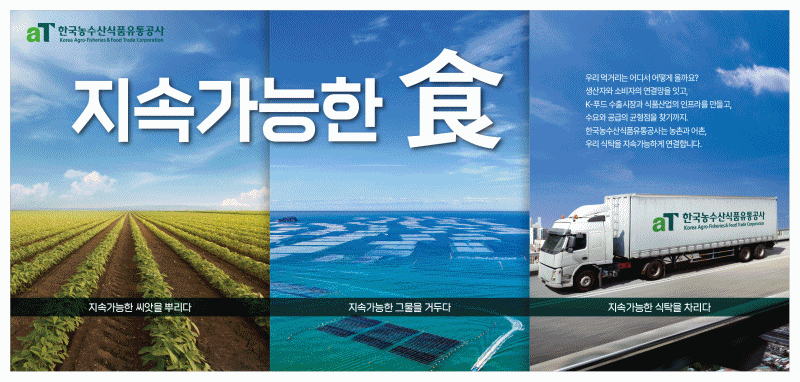농경연 “밭농업 지역별·품목별 맞춤형 전략 세워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통해 밝혀
밭농업은 논농업에 비해 재배품목이 다양하고 소득이 높아 재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경지면적에서 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9.2%에서 2015년 45.9%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한·중FTA 발효 등 시장 개방의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밭농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등은 최근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를 통해 노동력, 기계화, 기반정비, 조직화 등 밭농업 생산 측면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밭농업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력 수급체계를 개별 농가 차원이 아니라 조직경영체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용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효율적인 인력시장 형성을 위해 지자체, 전문기관, 지역의 조직경영체가 공동으로 지역의 밭작물 품목별, 월별 노동력 수요 자료를 생산하여 체계적인 노동력 확보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밭농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의 확대와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기계화 촉진, 작부 전환 등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기계 이용의 촉진은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농기계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작업반 등 조직단위의 공동 이용을 활성화하고 연중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 농업인 의견 조사 결과,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영세고령농의 비중이 높은 만큼 저렴하고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소형 농기구의 개발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밭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밭기반정비사업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시설의 안정적 이용 및 관리 능력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밭작물은 밭에서 생산되는 유형뿐만 아니라, 논에서 생산되는 밭작물 유형, 시설원예 집단화 지역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한 지역별, 유형별 맞춤형 정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 관개체계의 도입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농업경영체의 조직화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생산 단계에서 농지, 농기계, 노동력 등 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정부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를 논농업에서 밭농업으로 확대하고 주요 밭작물의 주산지 중심으로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품목별, 주산지별 특성에 따른 조직화 방안 모색도 제안했다. 농업경영체 조직화의 추진 방향은 기본적으로 가공·유통 분야에서의 조직적 역량을 제고시키되 이를 토대로 기반정비, 농기계 공동이용 등 생산단계의 조직적 성과 제고로 전환하는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홍상 선임연구위원은 밭농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지역별, 품목별 다양성이라고 지적하고, 밭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단위 농발계획, 원예산업 발전계획 등과 연계한 지역별, 품목별 맞춤형 중장기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