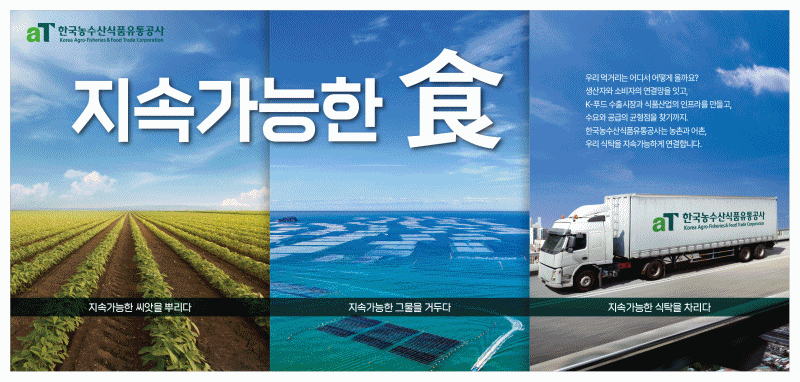"AI·구제역... 4조 4,038억원 혈세투입"
위성곤 의원 “이번 AI·구제역으로 총 3,597억원, 2010년 이후 3조 7,225억원 투입”
2003년 이후 AI로 1조711억원 투입, 8,132만 6천마리 살처분
2000년 이후 구제역에 3조 3,327억원 투입, 390만 7천마리 살처분
이번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으로 현재까지 총 3,59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또 구제역과 AI가 각각 2000년, 2003년에 최초 발생한 이후 모두 4조 4,038억원의 국민혈세가 소요됐으며 2010년 이후의 예산만도 3조 7,225억원이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속된 AI로 인해 올해 3월 27일까지 투입한 방역비용은 총 3,506억원이다.
이 가운데 살처분 보상비는 경기 1,262억원, 충남 593억원, 전북 521억원 등 2,980억원이며 살처분된 닭, 오리 등의 가금류는 모두 3,718만 마리다.
이외에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에 287억원, 생계소득안정에 143억원, 입식융자수매 등에 96억원이 소요됐다.
올해 2월 발생한 구제역에도 살처분 보상금 56억원을 포함해 91억원의 재정이 투입됐으며 1,392마리의 소가 살처분 됐다. 이처럼 이번 AI와 구제역에 모두 3,597억원이 방역비용이 발생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이미 1,687억원의 예비비가 사용됐다. AI가 현재도 계속 발생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투입 예산은 향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 AI와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래 살처분 등의 방역비용으로 들어간 금액은 무려 4조 4,038억원이고 가축의 살처분 두수는 8,523만 3천마리이며 2010년 이후만도 3조 7,225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됐다.
AI는 2003년 국내에서 최초 발생했다. 이후 총 8,132만 6천마리의 닭, 오리 등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1조711억원의 방역비용이 소요됐으며 2010년 이후는 7,681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2000년 최초로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의해선 모두 돼지, 소 등의 우제류 390만 7천마리가 살 처분됐다. 살처분 등의 방역비용은 총 3조 3,327억원이며 2010년 이후 소요액은 2조 9,544억원이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는 2010년 이후 연평균 5천억원 이상의 혈세를 AI·구제역에 탕진하면서 방역체계개선에는 너무 인색하다"며 "방역시스템 구축과 인력확보 예산을 대폭 늘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 의원은 "매해 반복되는 AI·구제역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며 "감사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해 방역당국의 책임소재도 철저하게 가려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름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