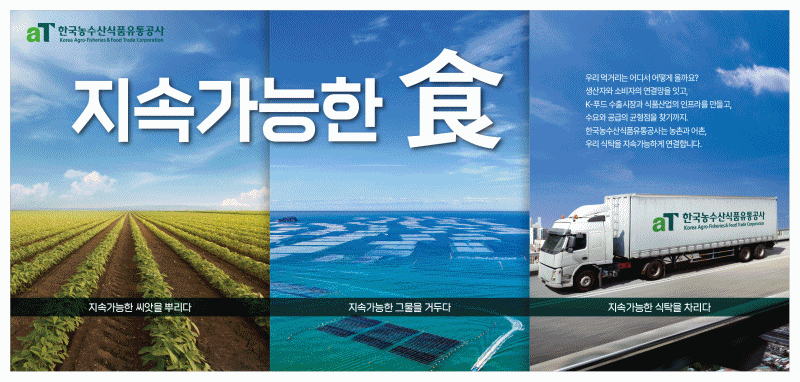◈일본의 참나무시들음병 발생 현황
1930년대 일본 남쪽지역인 가고시마현에서 최초 발생되었으며, 1950년대에 중북부지역인 야마가타현 등에서 발생 후 피해가 한동안 잠잠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일본 전지역으로 피해가 확대되면서 현재까지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2000년 12개 현에서 발생한 참나무시들음병은 2009년 23개현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는 23만㎥에 이르렀다. 일본에서 매개충에 의한 피해수종이 17과 27속 45종이 보고되어 있다.
◈방제의 기본방향 및 대책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의 기본방향은 피해확산 저지를 위한 리·동 단위 특별관리 체계 정착, 매개충의 생활사 및 현지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합 방제 방법 적용, 충점관리구역의 방제를 강화하고 GPS를 활용하여 피해구역 체계적 관리, 국립공원 등 중요한 보호지역을 우선적 방제,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로 권역완결 방제, 경관 및 자연 생태를 고려한 친환경 방제 추진이다.
◈참나무시들음병 발생 전망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병해충 등에 의한 참나무류 쇠퇴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나라 참나무시들음병은 일본의 참나무시들음병과 매우 유사하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그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었는데, 정확히 20년 후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피해확산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보다 적어도 20년 빠르게 병 발생 메커니즘 및 방제법 연구를 수행해온 일본에서도 아직 뚜렷한 방제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에서 그 피해가 증가 일변도에 있다. 피해수종도 물참나무, 졸참나무 등에서 가시나무류 등으로 피해 기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참나무시들음병 연구는 그 피해가 처음 발견된 2004년 이후 부터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에서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주 피해수종인 신갈나무가 없어진다 해도 매개충은 새로운 기주를 찾아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적어도 수십년간은 참나무시들음병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서상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부 산림병해충연구과> 산림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