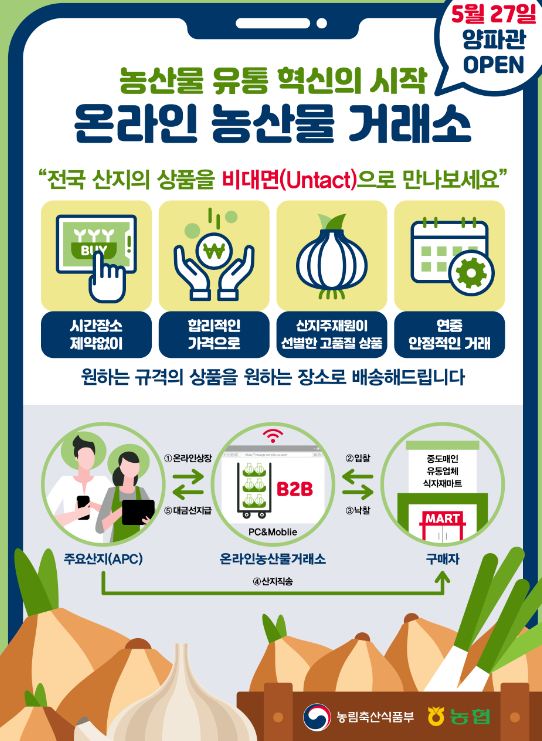- 농촌진흥청 멸구류 발생 조사, 발생 초기 적극 방제로 피해 예방해야
- 농촌진흥기관 통해 공동 및 개별 방제 조치…추가 방제로 밀도 낮춰
- 21일부터 서남해안 지역 4개도 20개 시군서 현장 점검

농촌진흥청은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멸구류 발생 조사 결과, 최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애멸구, 흰등멸구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사전 예찰과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흰등멸구는 우리나라에서 월동하지 못하고, 성충이 매년 6~7월 중국 남부지방에서 기류를 타고 들어와 벼에 알을 낳고 증식한다. 반면에 애멸구는 우리나라 논둑과 논 주변에서 약충(어린 벌레) 상태로 월동한 후 논으로 이동해 확산하거나 5~6월 성충이 기류를 타고 중국에서 들어와 벼에 알을 낳고 번식하기도 한다.
현재는 애멸구와 흰등멸구 발생 초기 단계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방제가 늦어 밀도가 증가하면, 벼의 양분이나 출수기 이삭의 즙액을 빨아 먹어 생육을 저해하거나 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발생 초기에 적극적인 방제로 밀도를 낮추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애멸구는 직접 가해해 피해를 주기보다 벼에 벼줄무늬잎마름병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충으로 관심 대상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애멸구 조사 결과, 보독충률이 0.5%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바이러스 매개에 대한 위험은 적은 것으로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각 도 농업기술원을 통해 애멸구, 흰등멸구 공동 및 개별 방제를 7월 19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7월 21일부터는 각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서남해안 지역 4개도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해 방제가 미흡한 지역은 추가 방제로 밀도를 낮출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애멸구, 흰등멸구 밀도가 증가하면 벼 생육 저하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농가 손실이 매우 커진다.”라며 “초기 적극적으로 방제하고 이후에는 반드시 재배지 내 밀도가 감소했는지 잘 관찰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6월, 우리나라로 유입된 벼멸구도 7월 중순 이후 고온이 지속되면 발육이 빨라져 대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예찰과 방제로 멸구류 피해를 적극 예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저작권자© 한국농촌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 1 구리도매시장, 설 '온누리상품권' 환급
- 2 '국산밀' 소비 활성화에 고심
- 3 작물보호협회, ‘2026 작물보호제 지침서’ 신청 중
- 4 농신보, ‘신용보증 사업추진 전략회의’ 개최
- 5 도드람양돈농협 "앞으로 현장 중심 전문 컨설팅 더욱 중시할 것"
- 6 마사회 노조, "경마장 이전"...전면투쟁 예고
- 7 ‘농할상품권’ 대규모 발행...15일까지 100억원 풀어!
- 8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와 '맞손'
- 9 한우협회, 설 명절 맞아 한우 최대 50% 할인
- 10 서울우유, 프리미엄 RTD 말차 라떼 신제품 ‘킹 말차 스트로베리’ 출시
- 돌발컷산림조합중앙회, 전국 종합평가 1위?...'정선군산림조합' 높은 평가
- 농생명과학농기자재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농산업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모집
- 식품&의약서울우유, 술 안주용 ‘한입치즈’ 선보여
- 협동조합&금융서울우유, 술 안주용 ‘한입치즈’ 선보여
- 복지•사회구리도매시장 현장 '농수산물하역원' 격려 눈길
- 유통소비구리도매시장 현장 '농수산물하역원' 격려 눈길
- 숲&환경산림조합중앙회, 전국 종합평가 1위?...'정선군산림조합' 높은 평가
- 건강•여행구리도매시장 현장 '농수산물하역원' 격려 눈길
- 축산뉴스서울우유, 술 안주용 ‘한입치즈’ 선보여